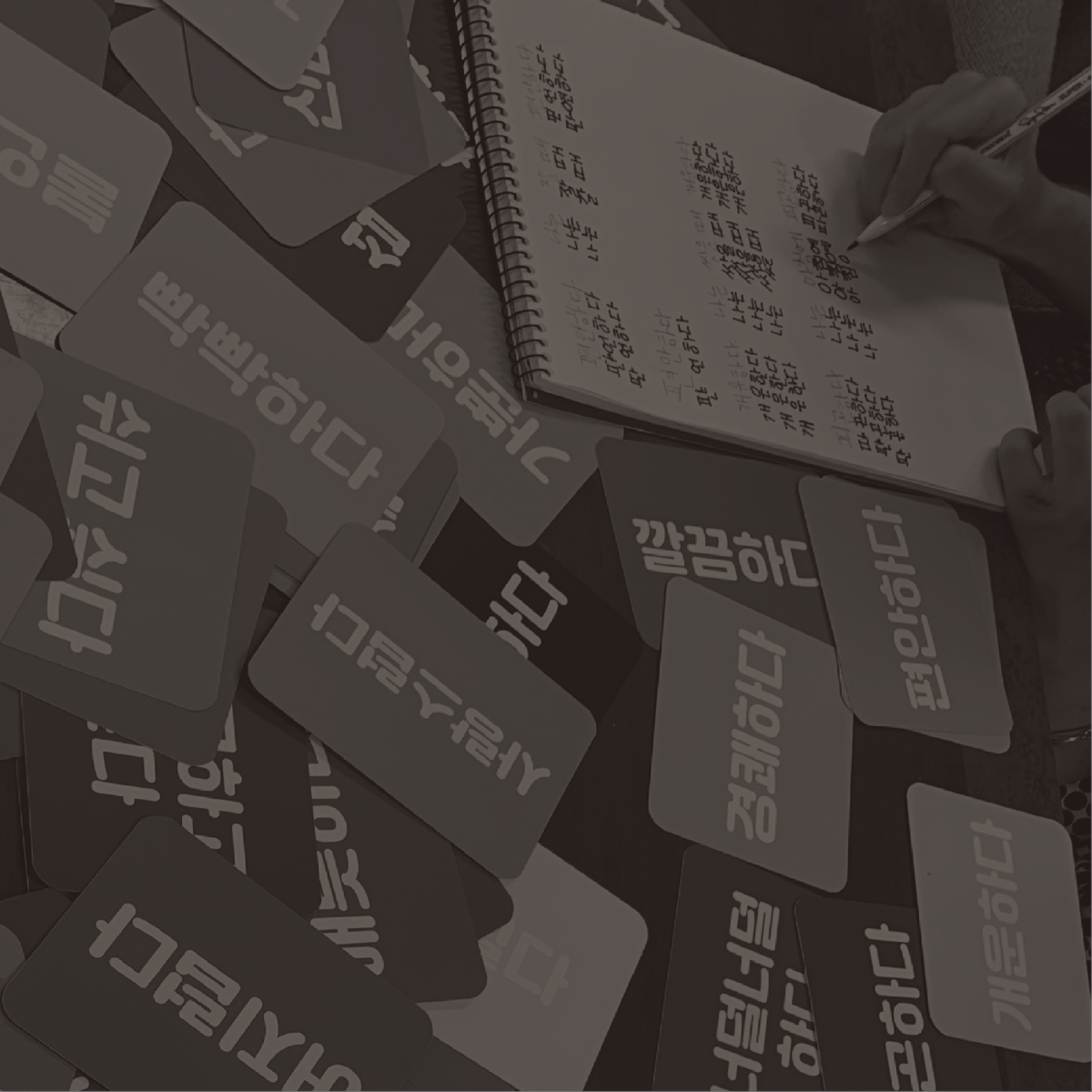어쩌다 노인복지관 수업을 맡게 되어 5주차의 강의를 끝냈다.
사실 강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내가 이 어르신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 분들도 뭘 배울 형편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은 한 시간 가량 그 분들이 하나라도 기억을 살려내고 그 기억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첫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길어지는 것을 기다리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차츰 차츰 순서대로 이야기도 하시고 남의 얘기도 듣기도 하시고 적당한 추임새를 넣게도 되셨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놀랍다고 했고 나 역시 빠르게 적응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가능성을 보았다.
처음엔 11시부터 40분 남짓 진행되다가 식사하러 가야된다고 자리를 떠버리시는 분들이셨는데 우리 한 시간 일찍 시작합시다 라는 어르신들의 제안에 10시에 시작에 30분은 워밍업으로 간단한 신체놀이를 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분께서 진행) 나머지 1시간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하고 어르신들이 말문이 터지던 순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더니 듣던 분께서 “자랑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셨군요.” 라고 하셨다.
오늘은 내가 맡은 강의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제 오후까지도 대체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랑할 수 있는 걸 말할 기회”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것들은 사라진 직업에 대한 것이었고 “제가 잘 모르니 얘기해주세요” 라며 하나씩 하나씩 물어나갔다. 사실 정말로 몰랐다. 내가 똥지게가 뭐고 물지게가 뭔지, 신기료 장수가 뭐며, 가마니를 어떻게 짜는지 알게 뭐겠나.
오늘은 11시 40분이 될 때까지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한 아버님은 노래 한 자락 해주겠다며 해방때쯤의 가사로 추정되는 노래를 불러주시고 자리를 뜨셨다.
이가 거의 없어 가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후반부의 가사는 이런 것이었다.
재주 좋은 제트기랑 (중략)
한시바삐 한국땅에서 주저앉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자유의 평화를 이제 볼까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과의 괴리는 엄청났다.
세월의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엄청났다.
동시대를 살아온 나의 할머니와 무척이나 다른 분들이셨다.
집에 돌아와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걸 말할 기회” 라는 힌트를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강사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며, 그들의 숨은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강의를 주로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하면 실수가 적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듣자하니 거슬리고 거북했던 강의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저 칭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를 보고 있는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재촉하는 것. 그런 자세는 마음에 든다.
혼자 전담했던 첫 강좌의 소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