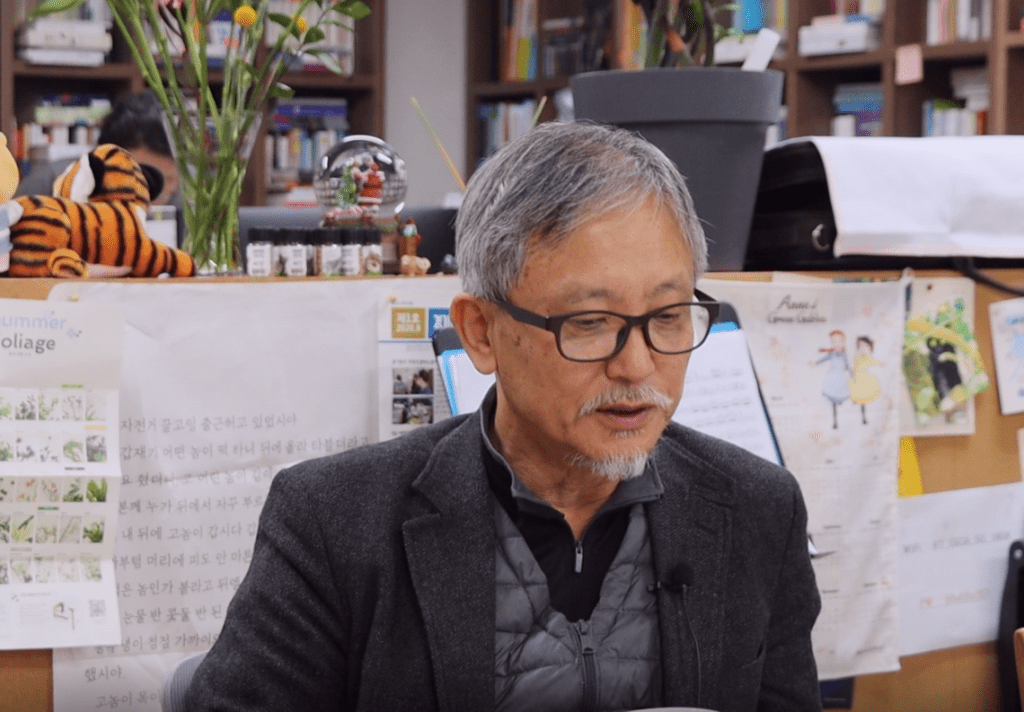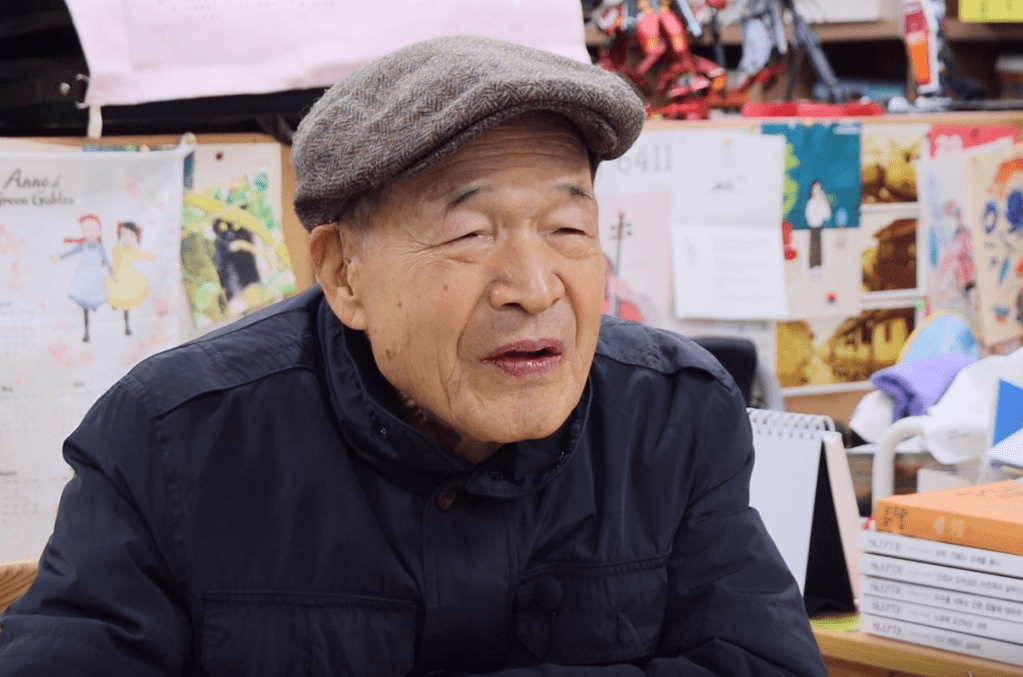1987년 민중운동을 읽어내려가다가 이석규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이 불과 몇 년전이다.
87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저 놀부 두손에 떡 들고” 라는 노래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수준이었다.
1987년은 6월 항쟁뿐 아니라 노동자대투쟁도 있었다. 8월 22일 대우조선에서 투쟁하던 노동자 이석규는 최루탄을 가슴에 맞고 숨졌다.
나는 서울대생 박종철과 연세대생 이한열을 기억지만, 이석규라는 이름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알게 되었다. 아무도, 이석규와 노동자대투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 때, 나는 그 대우조선소에 작업복을 버리고 올라온 남자와 막 연애를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은 모두 서울대였다. 서울대학생들이 서울역에서 회군을 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서울역 회군의 주동자 심재철은 그때부터 민주세력의 역적이다.
94년도에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의 등을 바라보며 호프집에서 맥주를 날랐던 나에게 찾아와 “내가 생각한 한총련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던 내 친구로부터, 이화여대 앞의 옷가게에서 티셔츠를 개고 있던 나와 마주친 학교 배낭을 멘 동창으로부터, 나는 수 십번 수백번의 박탈감을 느끼고 대학도 가본 놈이 데모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노동법이 뭐고, 산업재해가 뭔지 모르고 불 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 쓰러지는 언니들이 내가 읽는 잡지를 보고 “넌 좀 이상한 애 같아.” 라든가, “너 간첩이지?” 라는 우스꽝스러운 의심을 받았던 세월을 지나고 나니 나도 변하고 말았나.
마치 나도 서울대생이었던 것처럼,
서울역회군에 분노했던 선배가 있는 것처럼, 96년 연세대에서 질질 끌려나온 흰 바지 입은 여학생이 나인 것처럼.
조선소가 망해나가는 건, 정규직들이 노조일 하느라 바빠 현장을 돌보지 않아서라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성토를 들으며, 원청 새끼 개새끼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새끼들이라는 3차 하청 현장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뭐라고 생각한 건가.
소나타쯤 타고 다닌다고 내가 강남좌파쯤 된다고 착각한건가.
박탈감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착각해버리는 것이다.
나도 맘만 먹으면 3억짜리 벤츠 GT 정도는 살 수 있지. 중고차를 70개월할부로, 걔는 모아둔 용돈으로 새 차를. 이 차이를 모른 채, 내 자식이 누리는 풍요가 마치 80년대 내가 누리는 풍요인 양 착각하고 마는, 이 편리한 정신세계는 귀찮아서 나약해지는 것인가, 편리한 걸 찾는 것인가.
아무리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모기떼가 들러붙는 것같던 지겨운 여름이 지나간다. 이 여름, 9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그 중 대다수가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만들어온 세상을 본다.
서울대생들이 만들어온 온 세상에서 부르짖은 민주와 정의가 흔들리는 것을 본다.
서울대의 서울대에 의한 서울대를 위한 2019년 8월의 사건을 기억하자. 32년전 최루탄에 맞아 죽은 노동자의 이름은 지운 채, 그해에 죽은 대학생 둘을 더 또렷이 기억하는 세상에 매듭을 한 번 묶어본다.